[콩나물신문] ❝주름지지 않은 삶이란 없다❞
주름지지 않은 삶이란 없다
보육 기관에서 잠깐 일하던 시절, 내가 맡은 반에는 발달장애 아동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만은 않았다. 가끔이지만 아이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원하는 게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안 들어준다 싶으면, 아이는 나를 찾아와 내 손을 잡아끌고 자기가 원하는 것 앞에 섰다. 다른 선생님에게 혼이 나면, 나를 찾아와 그 큰 덩치를 내게 들이밀었다. 그만큼 나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아이에겐 분명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아이를 휘감았는데, 그럴 때면 팔(八)자 눈썹을 그리며 조용히 침잠하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다. 이 아이에게도 분명 감정이란 것이,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이 답답하고 미안했다.
그 ‘무능력’에 대한 양육자 ‧ 교육자로서의 자책, 아마 그것이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수많은 일들의 계기였을 것이다. 존 돈반 & 캐런 저커의 책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에 따르면 전기충격요법부터 응용 행동 분석(ABA), 촉진적 의사소통(FC), 그리고 MMR 백신 논란에 이르기까지, 자폐라는 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많은 일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겪는 아이들의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무엇)’을 덜어주고 싶었던 어른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매주 40시간씩 아이를 의자에 앉혀 수백 가지 과제를 수만 번씩 반복하게 하는 로바스식 ABA는 분명 학대에 가까운 기법이지만, 기계적인 반복 훈련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잡는 것마저 쉽지 않은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훈육법이다.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다가도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하고 선회하는 것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최소한’이라도 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는 다소 가혹하더라도 훈련하고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비-발달장애인의 오만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성인 자폐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신경 다양성(neurodiversity)’ 논의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1993년, 서른한 살 자폐인 당사자 짐 싱클레어가 자폐성 발달장애 관련 학회에 나타나 “부모들 역시 자폐 당사자에겐 하나의 문젯거리다”라고 비판했을 때,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분명 그의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들어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최소한’을 강조할수록,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 대한 부정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하루하루 아이의 장애와 씨름하고 좌절하는 부모들 앞에서 ‘당신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갈등과 논쟁의 역사 덕분에 장애 인권은 한 발 더 진보했다.
ENA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썸네일
얼마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같은 지하철에 올라탄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〇〇역까지 가는 데 몇 분 걸려요? 지금 여기서 지하철 타면, 〇〇역에 몇 분에 도착해요?” 그는 똑같은 말투, 똑같은 문장으로 두세 사람에게 반복해서 묻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은 헛기침을 하며 못 들은 척했고, 다른 누군가는 짧게 답을 해주었다. 역을 하나, 둘 지나는 사이, 열차 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면서 붐볐고, 그의 목소리는 곧 인파에 묻혔다. 그렇게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책 속의 구절을 떠올렸다. “자폐인이라는 것은 인류라는 옷감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주름일 뿐이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름지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날 만난 이가 자폐인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딘지 조금 달라 보였던, 그러나 자연스럽게 인파에 섞이던 그의 모습에서 나는 인류라는 옷감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주름을 본 것 같았다. 그 주름을 굳이 잡아 늘여 펼 필요가 없는 건, 우리 모두가 실은 어딘가 주름진 존재로, 주름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출근 투쟁, 탈시설 논의, 장애인 당사자의 TV 드라마 등장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이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격과 인권을 가진 동등한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더 널리 퍼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사회적·정치적 관심 부재로 인해 장애가 있는 자녀의 삶을 온전히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우리 중 하나,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어딘지 다른 사람’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도 불편해하지 않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 많은 ‘어딘가 다른 개인’들이 집 밖으로, 시설 밖으로, 특수학교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낯설고 불편한 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경험이 많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 말이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더 많은 삶의 주름들이 주름진 모습 그대로 집 밖으로, 골목으로, 놀이터로, 공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글 | 서이슬(작가, 콩나물신문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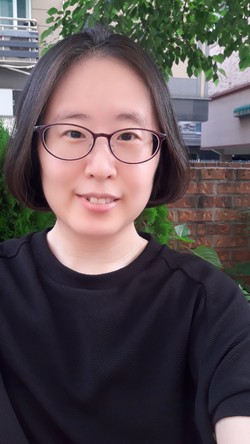
서이슬 작가. 지은 책으로 『아이는 누가 길러요』(후마니타스)가 있다.
🟣칼럼 전문 보기
https://bit.ly/주름지지않은삶이란없다
- 27 vi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