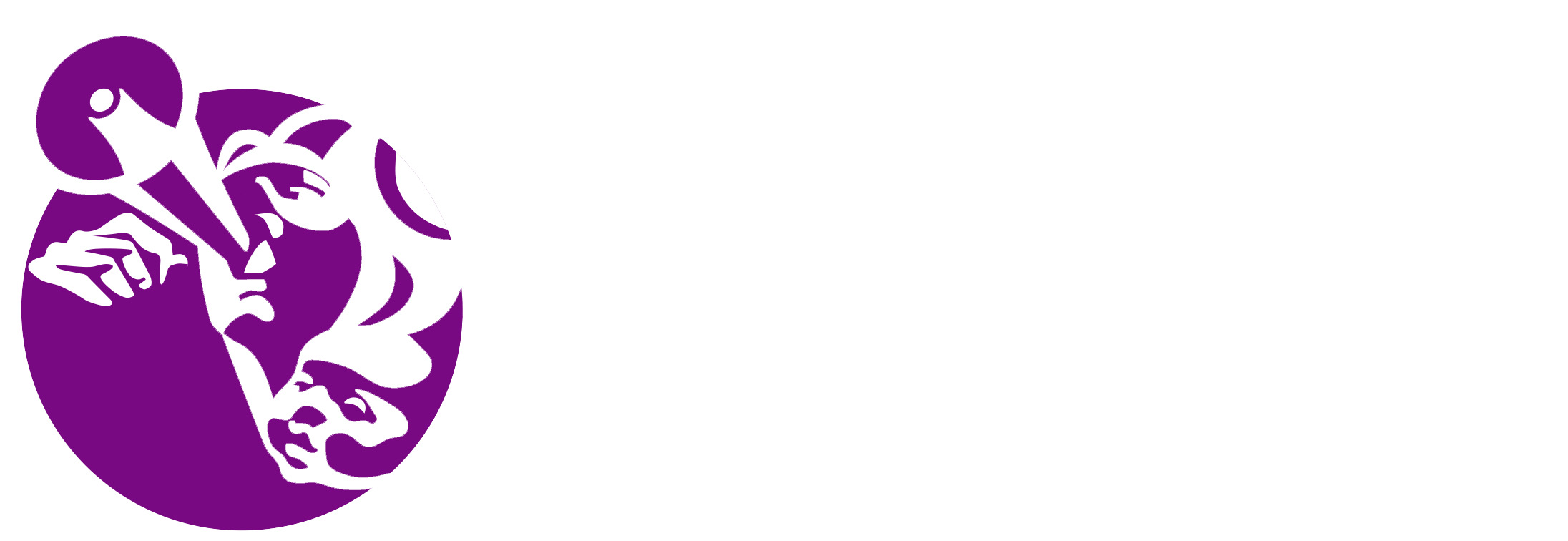[한겨레 왜냐면] 섭식장애 치료·지원 환경이 수십년째 황무지인 이유
박지니 ‘삼키기 연습’ 저자·잠수함토끼콜렉티브 대표
일주일 전, 10년째 섭식장애를 앓아온 아이가 자살을 시도해 급히 도시 외곽의 폐쇄병동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보호자로부터 받았다. 그 병원은 알코올 중독과 인지 저하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고 확신했지만, 해당 도시의 대학병원은커녕 어느 병원에서도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내가 이십대 초반 섭식장애 치료시설을 찾았던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는 국내에서 섭식장애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유일한 시기다. 당시 서울 강남권에 존재했던 세곳의 섭식장애 클리닉은 모두 개인 개원의가 세운 의원급 시설이었다. 이들은 치료 철학이나 원칙은 조금씩 달랐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외래진료와 낮병원(입원과 외래의 중간 개념), 입원 시설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이 값비싸고 야심 찼던 시도는 2010년 즈음해서는 쇠퇴에 접어들었다. 섭식장애 입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마지막 병원인 인제대 서울백병원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입원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2023년에는 병원 자체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
나는 이 1세대 의사들에게 당시 상황을 묻곤 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받은 적은 없다. “난이도가 높은 치료임에도 진료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다” “오히려 상급병원에서 섭식장애 환자를 우리 쪽으로 의뢰하는 처지지만, 상급병원에서 받는 것 같은 국가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부였다. 대학병원에서 섭식장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얼마 못 가 개원으로 방향을 바꿨던 의사는 내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할 뿐이었다.
1995년 국내 처음으로 섭식장애 클리닉이 개원했을 때 한 신문에 실렸던 인터뷰에 따르면 “섭식장애 증후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울산대 의대, 서울중앙병원, 고려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뿐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과 치료방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섭식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적 임상 지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섭식장애 치료에 대해 기본적 지식이라도 갖춘 정신과 의사 자체를 찾기 어렵다.
수십년째 변화 없이 이어진, 이 황무지 수준의 섭식장애 치료·지원 환경은 단지 섭식장애에 대한 대중적 인식 개선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설계에서 특정 집단만의 관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구조의 문제다. 국가 건강보험의 자원을 어떤 주체에, 어떤 의료에, 어떤 식으로 분배하느냐는 보상 체계 정합성 확보(incentive alignment)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같은 공공 자본을 어떤 의료에 투입할 것인가를 임상 현장의 노동자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질병 경험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소수 대학병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는 구조는 고소득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나 극히 드문 나라일 것이다.
의료수가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철저히 숫자 중심의 보고는 시민의 눈으로부터 많은 것을 감추기 위한 전략에 따른 정보공개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높은 장르인 메디컬 드라마에서처럼 선의의 의대 교수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공적 시스템을 시민의 권리로 여기기보다 위계에 기대는 봉건적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감시하고 청원해야 한다.
📰기사 전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10435.html
✅[서명하기] 아동·청소년 섭식장애,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 국가의 구조적 무책임에 맞서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 13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