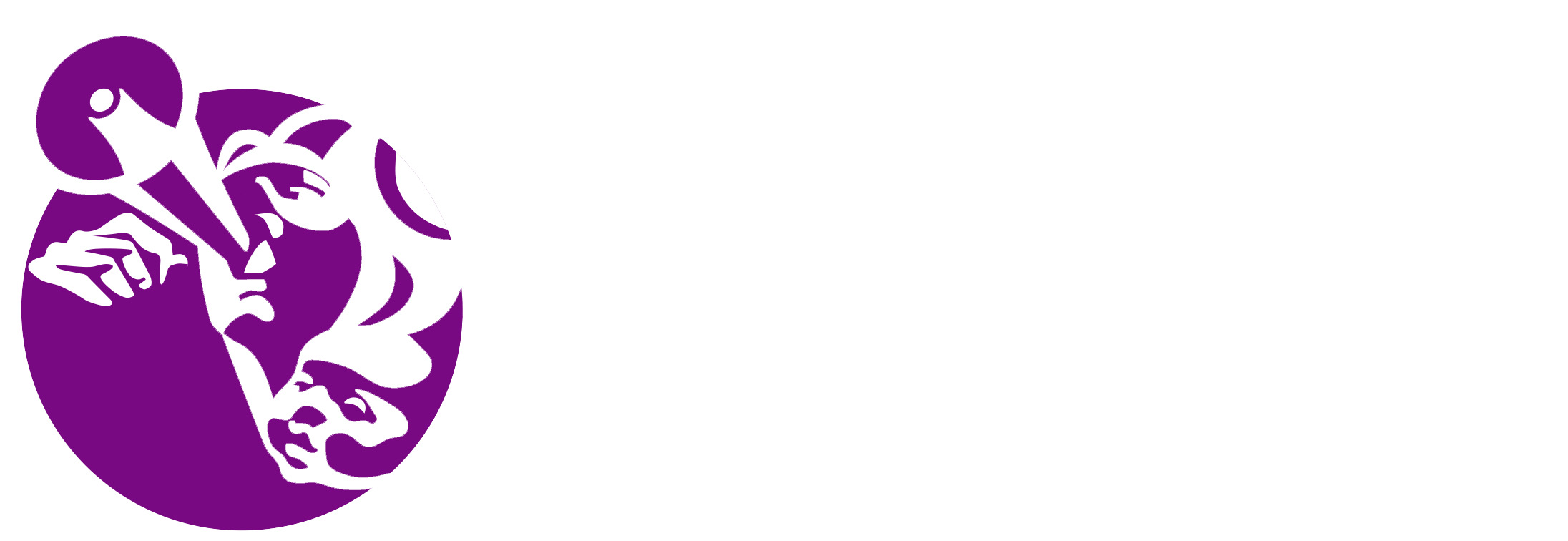[칼럼] 가족과 미국 유학 사이, 이 꿈의 끝을 잡고 싶었다 (윤정인)
[엄마 과학자 생존기] 나는 마리 퀴리가 되고 싶었고, 내 남편은 피에르 퀴리이길 바랐다
복직하고 3개월이 흘렀다. 시간을 압박하는 칼퇴근 덕에 실험 스킬은 나날이 발전했다. 연차도 오래되어 이제 논문세미나쯤은 3~4일 전에 발표자료를 만듦과 동시에 쭉쭉 읽어나갈 정도가 됐다. 역시 집중과 선택의 힘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내가 스스로 ‘만렙’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지도 박사님도 내게 ‘하산’을 명하셨다.
드디어 내게 ‘졸업’이 다가온 것이다. 졸업 준비 요건 역시 미리 채웠기에 당당하게 학교에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논문 신청을 할 때 결정할 사항이 있었다. 학위논문을 국문으로 할지 영문으로 할지 결정해야 했는데, 졸업을 앞둔 내겐 아주 큰 고민이었다. 일주일간 고민한 끝에 영문으로 결정했다. 원어민도 아니면서 영문으로 학위논문을 쓰겠다는 ‘건방진’ 결정을 내린 이유? 내가 ‘포닥’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공부하기 싫어서 포닥 안 한다"고… 아니, 사실 정말 하고 싶었다

이공계에서 대학생·대학원생이 된 뒤 학문의 길을 걷거나, 정부출연연구소(정출연)에 갈 때 필수 아닌 필수 코스가 있다. 바로 ‘해외 포닥(박사 후 연수 과정)’이다. 특히나 신약, 유기합성분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포닥 정도는 하고 들어와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포닥은 매우 중요한 경력이다.
이전 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사실 정출연에 자리를 잡고 싶었다. 학교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저 학위과정 때처럼 정출연에서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내고 싶었다. 나의 어린 시절 꿈은 연구소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포닥을 한다면 미국에 꼭 가고 싶었다. 미국에 가서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스크립스연구소에서 포닥을 해보고 싶었다. 같은 연구실에 이곳에서 포닥하고 오신 박사님들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꿈을 꿨더랬다. 석사를 시작한 게 2009년이었으니까, 그때 석사 과정 시작과 동시에 박사를 생각했고, 당연히 포닥까지 마친 후 연구원의 삶을 꿈꿔온 내게 포닥은 2009년부터 2014년 겨울까지 이어져 온 당연한 목표였다.
그런데 그 계획을 접었다. 나는 포닥을 포기하고, 정출연 연구원이라는 꿈도 함께 포기했다. 주변에서 “왜 포닥 안 해?”라고 물었을 때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정말 가고 싶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포닥을 가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 엄마가 되고 나니, 인생 계획에 '나'만 있다고 될 것이 아니었다
제일 먼저 아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세 가지의 문제가 얽혀 있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남편도 아직 모르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지만, 결혼생활도 곧 10년이 다 되어가고, 이 정도는 남편이 이제 ‘그러려니’하고 넘겨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글을 써 보겠다.
내가 포닥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는 빠르면 돌 직후, 늦어도 두 돌 즈음엔 외국에서 생활하게 된다. 문제는 내가 포닥을 나가려면 미리 3~6개월 정도 혼자 나가서 가족을 데리고 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다.
아이가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신랑은 “내가 다 할게”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내가 슬그머니 이 문제를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니 기겁을 한다. 자기 혼자서는 아이를 볼 수 없다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포닥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갓난아기를 둘러업고서라도 포닥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었다.
게다가 신랑은 영어 울렁증이 심했다. 그리고 낯선 환경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나와 같이 새로운 곳에서 살자고 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했다. 결혼 전엔 ‘포닥’ 남편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살아보니 이 남자가 정말 그렇게 살긴 좀 힘들어 보여 함께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한 부분도 있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의 남편과 함께 가면 아마 힘든 일이 더 많아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신랑에게 “당신은 남고 나 혼자 1년만 다녀오면 안 될까?”라고 물어봤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이 이야기를 우리 신랑은 절대 기억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나는 포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다.
그날도 신랑에게 미끼를 툭툭 던지고 있었다.
“나 1년만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아기 데리고 나 혼자 다녀올게. 아니면 당신이 땡그리랑 6개월만 기다렸다가 들어와. 내가 거기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노력해볼게.”
내 말을 가만히 듣던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떡해?”
신랑의 말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라고 하고 싶었으나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랑의 말이 내게 쐐기를 박았다.
“왜 당신은 인생에 내가 없어? 당신의 인생엔 항상 당신만 있고 나와 아기는 없어?”
남편의 그 말은 내가 인생 계획을 수정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됐다. 남편의 말이 맞다. 내겐 가족이 있다. 인생을 계획할 때 연구자로서의 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포닥은 엄청난 기회고, 스릴 넘치는 모험이었겠지만, 단순히 나의 가족이란 이유로 함께 가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녹록지 않은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낯선 나라,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나는 연구라는 목표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됐겠지만, 그건 내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내 가족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연구소장이 되겠다는 꿈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포닥을 포기하고 정출연에 대한 미련도 접었다.
◇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나는 ‘마리 퀴리’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포닥 전에 가족이 있으면 나가서 외롭지 않을 테니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선배들은 박사과정 때 결혼을 했고,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와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가거나 혹은 포닥을 갔으니까. 나 역시 그런 순서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선배들의 모습만 떠올렸지, 함께한 배우자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함께 공부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집에서 출근한 남편만 기다려야 했을 선배의 배우자들이 어떤 삶을 보냈을지 고민해보지 않았다. 그 선배들은 남자고 나는 여자니, 만약 내가 포닥을 갔다면, 남편이 그 선배들의 와이프처럼 집에서 나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고 데려오는 생활을 해야 했을 것이다.
남편은 심지어 장남이다. 부모님 세대 대부분 그렇듯, 우리 시부모님도 노후준비가 완벽히 된 분들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날이 올 것이고, 나 역시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었다. 외국에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나의 삶이 남편에겐 부모를 버리란 뉘앙스로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나는 포닥을 포기했다. 사실 늘 아쉽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에서 새로운 연구를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그 아쉬움의 끝은 ‘나에게 아이가 없었더라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란 생각으로 이어질 때 있다.
포닥 포기를 결심한 날, 나는 영문으로 학위논문을 쓰기로 했다. 아직 화학 분야에선 영어가 주된 언어로 쓰인다. 대부분의 용어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마쳤다. 토익 성적은 안 봐도, 이 연구원이 영어로 논문을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관심을 많이 둔다. 그래서 나는 논문을 영어로 썼다. ‘나는 외국에서 포닥을 하진 않았지만, 영어로 학위논문을 쓴 사람이다’라는 커리어로 승화시켰다. 그 덕에 취업은 곧잘 했다.
나는 마리 퀴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내 배우자는 피에르 퀴리가 되길 꿈꿨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꿈으로 두어야 할 것 같다. 아이를 키우면서 실험에 올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므로 나는 마리 퀴리가 될 수 없었고, 내 남편은, 와이프를 위해 실험실까지 차려준 피에르 퀴리같은 남편이 될 수 없었다(뒷바라지의 개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어디선가 포닥을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혼자 몸이라면 가길 추천한다. 두런두런 들어보자면 포닥은 결혼과 비슷해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한다. 그러니 그냥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아이 문제만으로 포기하진 않았으면 한다. 포닥의 삶과 엄마의 삶은 경쟁 선에 놓인 삶이 아니다. 이 두 삶은 충분히 공존 가능한 삶이며, 그 공존을 위해 할 방법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속마음을 숨기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용기가 없었다. 한 번도 신랑에게 정면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툭툭 나오는 신랑의 이야기를 취합해 혼자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뿐이다. 그러니 나처럼 용기없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
아까 나는 내 남편이 피에르 퀴리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사실 우리 신랑은 어쩌면 피에르 퀴리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당신의 배우자 역시 피에르 퀴리를 닮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칼럼니스트 윤정인은 대학원생엄마, 취준생엄마, 백수엄마, 직장맘 등을 전전하며 엄마 과학자로 살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이 되었고, 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서 젠더다양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프로불만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사 다니는 유기화학자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출처: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04
- 52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