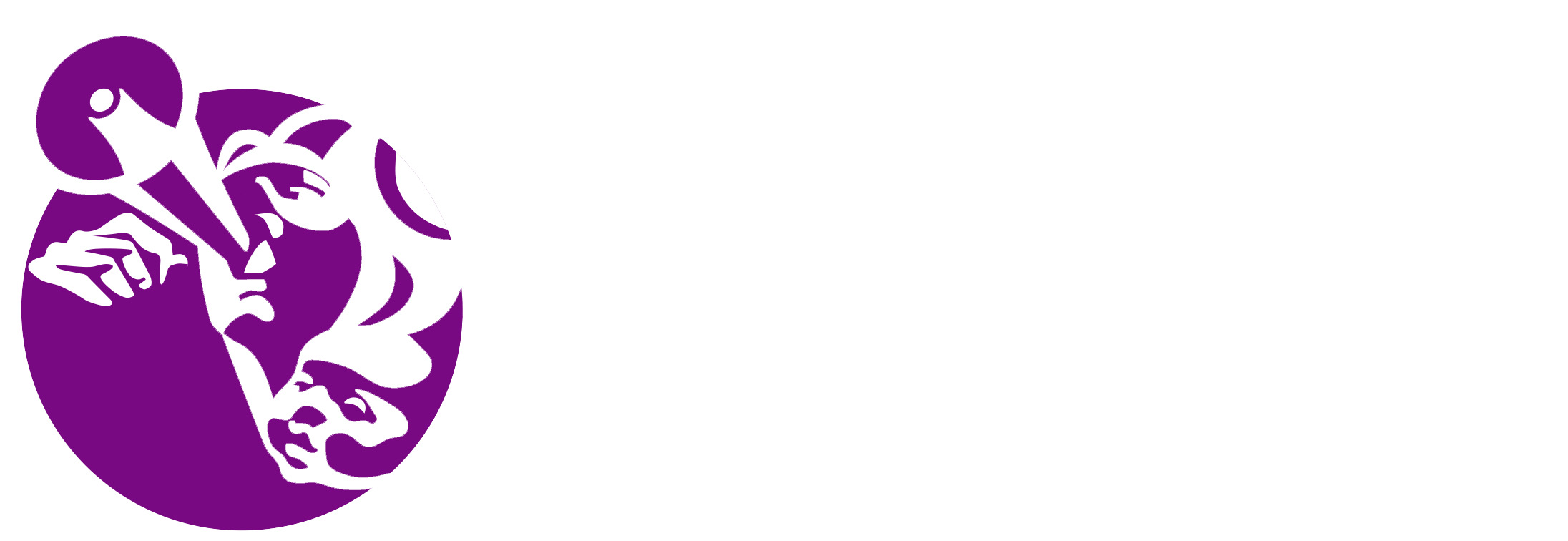윤석열이 대통령 된 나라까지 바꾸자고 다짐하며 광장을 지켰던 여러 운동들이 집회를 준비 중이다.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라는 부제를 달았다. 또 다른 무엇으로 그리든 우리가 안녕할 나라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모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크고 작은 자리들이 이어질수록 가까워진다. 비상계엄 이후 세상이 혼탁하고 일상이 헝클어지는 동안에도 안녕했던 순간을 떠올려본다. 어디에 있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각하며 벅찼던 순간들. 위협도 불안도 긴장도 결핍도 없어서 안녕했던 것이 아니다. 위기를 함께 겪고 있음을, 결정하는 자와 위험을 떠안는 자가 구분되지 않을 것을 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등으로, 우리는 안녕했다.